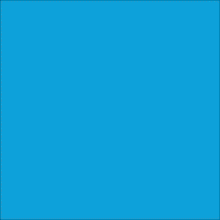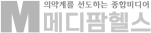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혈액이 헌혈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채혈되거나, 이들 혈액이 다른 사람에게 수혈되거나 혈액제제에 사용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원희목의원은 최근 2건의 사례를 분석, 검체 검사 결과 모두 말라리아 음성으로 판명돼 수혈로 인한 감염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양성이었을 경우 5명이 수혈로 인해 말라리아에 감염되는 대형 혈액사고가 터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말라리아‘헌혈 부적격자’헌혈 건수 2009년 이후 2064건
원의원은 현재의 혈액관리시스템이 이런 ‘요행’에 기대고 있는 한 언제든지 ‘수혈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혈혈액에 대해 말라리아 검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수혈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12건이나 있었다고 원의원은 밝혔다.
말라리아 감염 위험이 있는 ‘헌혈부적격자’들이 헌혈한 건수가 200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2064건에 달한다.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에 해당하는 건수가 1854건(90.0%)으로 가장 많고, ‘국외 말라리아 위험 지역 여행’이 192건(9.3%)이다. 말라리아 병력이 있었던 사람이 헌혈한 건수가 15건(0.7%), 헌혈 후 말라리아 감염이 확인된 건수가 3건(0.1%)이다. <표-1 참조>
<표-1> 말라리아 관련 헌혈 부적격자 헌혈 건수(단위: 건)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8월 |
계 |
|
헌혈유보기간내의 국내 말라리아 지역 여행, 거주, 복무 경력자 |
748 |
425 |
681 |
1,854 |
|
헌혈유보기간내의 국외 말라리아 지역 여행, 거주, 복무 경력자 |
78 |
63 |
51 |
192 |
|
말라리아 병력 |
3 |
2 |
10 |
15 |
|
말라리아 검사 |
0 |
1 |
2 |
3 |
|
계 |
829 |
491 |
744 |
2,064 |
|
※ 자료: 대한적십자사.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 ||||
말라리아 부적격혈액 72% 사용
헌혈 혈액은 적혈구, 혈장, 혈소판 등 혈액제제로 분리되어 수혈로 사용되기도 하고, 혈액제제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약회사에 공급되기도 한다.
'말라리아 헌혈 부적격자 혈액’ 또한 혈액제제로 분리되어 출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064건의 혈액은 5059unit의 혈액제제로 만들어졌다. 이중 72.9%에 해당하는 3687unit의 혈액제제가 출고되었다. <표-2 참조>
<표-2> 말라리아 부적격 혈액 출고 현황(2009~2011.8)
|
헌혈건수 |
혈액제제수(unit) |
폐기 단위수(unit) |
출고 단위수(unit) |
|
2064건 |
5059(unit) 100% |
1372(unit) 27.1% |
3687(unit) 72.9% |
※ 자료: 대한적십자사.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OECD 중 한국 터키 멕시코에서만 발생 / 한국이 발생률 1위
한편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말라리아 발생 1위 국가로 알려졌다. 말라리아는 세계적으로 아프리카 중남부, 라틴아메리카, 중동지역, 동남아 등지에서 유행하는 데, 최근 OECD 국가 중에서는 한국, 터키, 멕시코에서만 발생했다.
2009년 인구 10만 명당 말라리아 발생률이 한국 2.7명, 멕시코 2.4명, 터키 0.1명으로 한국이 1위이다. <표-3 참조>
<표-3> 말라리아 발생 OECD 국가
|
국가명 |
인구 10만 명당 발생률 |
2009년 환자 수 |
|
한국 |
2.7명 |
1,345명 |
|
멕시코 |
2.4명 |
2,703명 |
|
터키 |
0.1명 |
84명 |
|
자료: 질병관리본부(2011.9) 원희목의원실 재구성 / 2010년 우리나라 말라리아 환자수는 1772명
| ||
말라리아 병원체 - 수혈감염위험도 1군
2011년 질병관리본부는 ‘수혈감염 가능성, 생물학적 위험도, 대중적 우려’등을 종합평가해 총 89개 병원체를 선정, ‘수혈감염위험도’ 1군에서 4군으로 나누었다. 그 중 1군은 “우리나라에서 수혈감염 발생 사례가 보고된 적이 있거나, 세계적으로 수혈감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병원체로, 수혈감염 가능성과 위중도가 높아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병원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1군에 속하는 병원체가 말라리아원충, 바베스열원충,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 바이러스, 인간면역결핍 (에이즈) 바이러스 다섯 가지이다. 실제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국내에서 수혈로 인한 말라리아 감염 사례가 12건 있었다.
헌혈 시 말라리아 감염 위험자 발견‘문진’에 의존
이처럼 말라리아는 수혈감염 위험이 높지만, 아직 법적으로 간염이나 에이즈처럼 헌혈 혈액 검사 대상이 아니라서 오로지 사전 문진에 의존해 헌혈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있다. 문제는 헌혈자들이 국내외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여행했거나 병력이 있는 것을 문진할 때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헌혈 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헌혈 후’ 적십자사가 알게 되는 경우도 대부분 헌혈자 본인이 알려오는 경우에 의존하고 있다. 헌혈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부적격 혈액’인지 모른 채 혈액은 유통될 수 밖에 없다. 헌혈 후에 말라리아 검사에서 양성임이 드러나 질병관리본부의 통보로 인해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어찌되었던 적십자사는 ‘헌혈 과정’에서가 아니라 ‘헌혈 이후’에, 그것도 불완전하게 말라리아 혈액을 걸러내고 있는 것이다.
헌혈혈액 말라리아 검사 및 사후‘검체 검사’도입해야
이처럼 말라리아 위험지역 여행사실이나 병력을 문진에서 발견해 헌혈을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말라리아 수혈감염을 차단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수혈감염위험도 1군 병원체처럼 말라리아에 대해서도 헌혈 혈액 검사를 해야 한다.고 원의원은 촉구했다.
또한 현재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거주 또는 여행한 헌혈부적격자의 혈액은 헌혈 이후 헌혈부적격자임이 밝혀져도 ‘보관 검체’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이들로부터 수혈받은 사람에 대한 추적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사전 검사 뿐만 아니라 사후조치에 있어서도 미진한 것이다. 따라서 ‘보관 검체’에 대한 사후 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