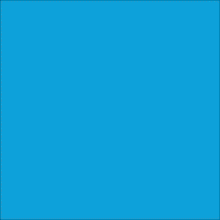입안이 헐거나 혀에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은 피로, 스트레스, 면역 저하 등 일상적인 요인으로 흔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일주일 내외로 회복되지만, 일부는 단순 염증이 아닌 초기 구강암 신호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강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자칫 지나치기 쉽고, 발견이 늦으면 말하기, 씹기, 삼키기 등 기본적인 기능에 큰 장애가 남을 수 있다.
구강암은 입안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편평상피세포암이 전체의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 이 외에도 선암, 사마귀상암종, 침샘암, 육종, 림프종, 흑색종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주요 위험 요인은 흡연, 음주, 불량한 구강 위생이다. 특히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할 경우 발생 위험이 약 10~15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틀니, 손상된 치아 등 만성적인 자극, 인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 구강 점막 만성 염증 등도 위험 요인으로 꼽힌다.
구강암의 대표적인 초기 신호는 3주 이상 낫지 않는 궤양, 구강 점막의 백반증(흰 반점)과 적반증(붉은 반점) 등 점막 변화다. 통증이 거의 없어 단순 구내염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2~3주 이상 지속되면 조직검사가 필요하다. 병변 위치에 따라 증상도 다르다. 혀 밑이나 입천장 등 눈에 잘 띄지 않는 부위는 통증이 적고 양성 종양과 구분이 어려워 조기 진단이 늦어지기 쉽다. 암이 진행되면 통증, 출혈, 입냄새, 체중 감소, 턱 운동 제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김현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구강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고, 진단 시 이미 주변 조직이나 림프절로 전이된 사례도 적지 않다”며 “3주 이상 지속되는 궤양이나 점막 변화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단은 조직검사가 핵심이다. 의심 부위를 국소마취 후 떼어내 현미경으로 확인한다. 전이 여부 확인을 위해 CT와 MRI를 시행한다. CT는 턱뼈 침범, MRI는 혀와 근육 등 연조직 침범을 정밀하게 평가한다. 상부 호흡기, 소화기관에 동시성 암이 생길 수 있어 위내시경, 대장내시경이 권고된다. 치료 전후 재발 여부 확인에는 PET-CT가 도움이 된다.
치료는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을 병합해 진행한다. 수술은 암 조직 제거와 필요시 턱뼈 절제, 경부림프절 절제, 구강 재건술 등을 포함한다. 조기 구강암은 수술 또는 방사선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전이가 의심되거나 재발 위험이 높은 경우 항암방사선치료를 병행한다. 항암제는 단독 치료 효과는 제한적이지만, 방사선 반응을 높이거나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 보조적으로 사용된다.
김현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구강암은 치료는 말하기, 씹기, 삼키기 같은 생활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영양 관리, 언어 치료, 재활 등 다학제적 접근이 필수”라며 “조기 발견할수록 치료 부담과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강암의 5년 생존율은 약 56%로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금연, 절주, 꾸준한 구강 검진, 틀니나 보철물 교정 등이 예방의 핵심이다. 과일과 채소 섭취 증가, 항산화 비타민 A·C·E 섭취도 점막 건강에 도움이 된다.
김현제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치과 교수는 “3주 이상 낫지 않는 상처나 백반증, 적반증 같은 변화를 발견하면 즉시 진료를 받고, 흡연, 음주, 만성 자극 등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이 구강암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