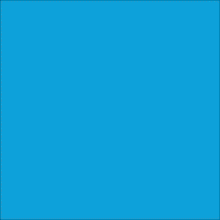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구조가 아니다.
후생노동성, 문부과학성, 재무성, 총무성이 수요 예측, 인력 양성, 재원 승인, 정책 집행을 분담하는 다원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 한 부처가 “필요하다”고 말해도, 다른 부처가 데이터와 재정으로 이를 검증한다. 느리고 복잡하지만, 정치적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독주할 여지를 차단하는 구조다.
정책의 근거 역시 감이나 여론이 아니라 데이터다. 일본은 ‘의사편재지표’를 통해 지역별 의료 수요 대비 의사 공급의 과부족을 수치로 설명한다. 단순한 의사 수가 아니라 실제 진료 활동량, 인구 구조, 질병 양태, 의료 이용 행태, 환자 이동까지 반영한 지표다. 정부는 이 지표로 “어느 지역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만 개입한다. 설명할 수 없다면, 정책도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반면 지역정원제에 대해서는 일본조차 냉정하다. 지역정원제는 단기적 숫자 분산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 지역 정착과 의료 질 개선을 담보하지 못한다. 의무복무가 끝난 뒤 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은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구조적 결과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현실은 불편해진다. 우리는 과연 의사인력 정책을 데이터와 합의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 일정과 속도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고 있는가.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지는 빠르게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의사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 없이 추진되는 증원은, 몇 년 뒤 또 다른 불균형과 갈등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의사인력 정책의 정당성은 행정 명령이나 여론전으로 확보되지 않는다. 전문가 집단의 전문적 자율성을 배제한 정책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일본이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하다. 의료는 숫자로 통제할 수 없으며,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의사 수를 늘릴 것인가가 아니라, 의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다. 총량 증원은 답이 될 수 있지만, 출발점이 될 수는 없다. 정책이 의료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면, 숫자보다 먼저 구조를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