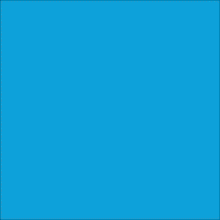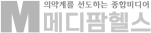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에 따른 후천성 척수 손상으로,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척수 장애인들에게 배뇨관리를 위한 『자가 도뇨 카테터를 필수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가 도뇨』란 정상적 배뇨활동이 불가능한 척수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배뇨 방법으로, 요도를 통해 관모양의 얇은 호스인 ‘카테터’를 삽입하여 소변을 배출하며, 정해진 시간에 맞춰 하루에 4회에서 6회 실시한다.
현재 정부는 『신경인성 방광』 보유자에 대한 『자가 도뇨 카테터』건강보험 적용(요양급여)을 201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선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니, 후천성 척수장애인에게는 지원이 전무한 상태이다.
201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체장애인 130만명의 약 4.9%인 63,485명이 척수장애인이며, 이 중 자가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척수장애인(후천성)은 49.6%인 31,489명에 이른다.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로 분류된 척수장애인들은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와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받지만, 카테터에 대해 건강보험에 의한 요양급여 지원을 받지 못해 소변배출을 위해 월 27만원¹의 비용부담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으로 인해 일회용 소모품인 ‘카테터’를 재사용하다 보니 요로감염, 방광요관 역류 등 합병증을 겪게 된다.
*¹선천성 신경인성 방광 환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기준
: 9,000원/일(카테터 개당 1,500, 1일 최대 6개) × 30일 = 27만원
한편, ‘카테터’는 식약처 내규 상 ‘일회용 소모품’으로 분류되어 있어 재사용이 금지된 소모성 재료이다.
문정림 의원은, “대부분의 OECD 가입 국가들은 자가 도뇨 카테터에 대한 보험적용을 선천성, 후천성 척수장애인 모두에게 하고 있음은 물론, 월 카테터 개수에 보험적용 제한을 하지 않는다[표 2]”며,
“후천성 척수장애로 인한 신경인성 방광 소유자에게 생존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자가도뇨 카테터’의 건강보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표 1] 자가도뇨 카테터가 필요한 척수장애인 수
적용 | 인원(명) | 산출근거 | |
A | 지체장애인의 수1) | 1,295,608 | 2014 통계청 등록장애인 통계 |
B | 척수장애인의 수 | 63,485 | 척수손상 비율2)(4.9%)×A |
C | 자가도뇨가 필요한 척수장애인의 수 | 31,489 | B×49.6%3) |
[출 처]
1) 2014년 통계청 장애인 통계 중 지체장애인 수
2) 2014 장애인 실태조사 자료 중 지체 장애의 원인 중 척수손상 비율(4.9%)
3) Cameron 등 J. Urology의 미국 척수장애인의 배뇨방법 현황 중
자가도뇨 비율(2010)
* 1), 2), 3)을 이용하여 문정림 의원실에서 구성한 자료
[표 2]
OECD국가의 월 카테터 지원 개수 및 지원금액
한국(후천성) | 0 |
한국(선천성) | 180개/월(240,000원) |
미국 | 200개/월(메디케어) |
영국 | 제한 없음(필요한 만큼 처방) |
프랑스 | 제한 없음 |
일본 | 241,062원/월 |
스페인 | 제한 없음 |
네덜란드 | 제한 없음 |
노르웨이 | 제한 없음 |
덴마크 | 제한 없음 |
독일 | 제한 없음 |
스웨덴 | 제한 없음 |
체코 |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