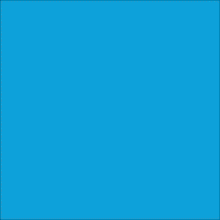K-팝, K-푸드, K-메디컬에 이어 이제 K-뷰티까지. 한류의 지형도는 더 이상 문화 콘텐츠에 머물지 않는다. 산업과 규제, 그리고 국가 신뢰가 결합된 ‘종합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
K-팝, K-푸드, K-메디컬에 이어 이제 K-뷰티까지. 한류의 지형도는 더 이상 문화 콘텐츠에 머물지 않는다. 산업과 규제, 그리고 국가 신뢰가 결합된 ‘종합 브랜드’로 진화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밝힌 2025년 화장품 수출 실적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은 전년 대비 12.3% 증가한 114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중 매달 최고 기록을 새로 썼고, 9월에는 사상 처음 월 수출 11억 달러를 돌파했다. 미국이 최대 수출국으로 처음 1위에 오른 것도 상징적이다. 중국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202개국으로 수출 대상국이 확대됐다는 점은 K-뷰티가 ‘유행’이 아닌 ‘산업’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성과의 이면에는 민간 기업의 노력만큼이나 정부의 보이지 않는 손, 특히 식약처의 역할이 컸다. 규제 외교를 통해 해외 장벽을 낮추고, GMP와 국제표준의 상호 인정을 추진하며, 글로벌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온 결과가 지금의 숫자로 나타난 것이다. 규제기관이 ‘발목을 잡는 존재’가 아니라 ‘산업의 길을 닦는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모범 사례다.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가장 냉정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수출이 늘었다는 사실이 곧 경쟁력을 영구히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안전성 평가제, 원료 규제 강화, 환경·윤리 기준은 앞으로 K-뷰티가 반드시 넘어야 할 또 다른 장벽이다. 수출 증가의 이면에서 현장의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가 없는지, 중소·중견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 부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촘촘히 점검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검토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즉각 개선하는, 믿을 수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 화장품 업계 역시 자구책을 고민해야 한다. 프랑스를 비롯한 글로벌 명품 브랜드와의 경쟁은 단순히 가격이나 트렌드로는 이길 수 없다. 첫째,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 ‘규제를 통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규제가 없어도 신뢰받는 수준’을 목표로 해야 한다. 둘째, 원료·제조·임상·데이터에 이르는 전 과정의 스토리텔링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소비자는 이제 화장품을 바르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의 철학을 소비한다. 셋째, 단기 히트 상품 중심 전략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 K-뷰티의 약점으로 지적돼 온 ‘빠른 교체’와 ‘짧은 생명력’을 극복하지 못하면 글로벌 명품의 벽은 넘기 어렵다.
K-뷰티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지금의 성과를 일시적 호황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시장에서 프랑스·미국 등 이른바 유명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장기 산업으로 키울 것인지의 선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정부는 규제의 틀을 세계 기준에 맞게 정교하게 다듬고, 업계는 그 틀을 뛰어넘는 품질과 신뢰로 답해야 한다.
식약처가 밝힌 “우수한 국산 화장품의 세계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이제 그 약속이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차례다. K-뷰티가 숫자를 넘어 ‘신뢰의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치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