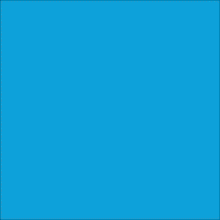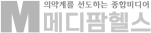미국수면학회(AASM)는 최근 성명을 통해 폐쇄성 수면무호흡증(OSA) 이 부정맥 치료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전극도자절제술(catheter ablation)이나 정기충격요법(cardioversion) 이후에도 심방세동(atrial fibrillation) 의 재발 위험이 높아지거나, 항부정맥제의 치료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부정맥 환자에게 수면다원검사(polysomnography)를 통한 수면 질 평가가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수면장애를 넘어서 심장 전기생리 이상과의 밀접한 연관성이 다수의 연구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주목할 점은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이 부정맥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사실이다. 수면 중 반복되는 무호흡과 저산소증, 교감신경계의 항진은 심장 리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그 결과 심방세동뿐 아니라 서맥, 심실성 부정맥 등 다양한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부정맥이 수면 중 발생하거나 야간 시간대에 악화되는 경우, 환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심전도, 호흡, 산소포화도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면다원검사는 원인 파악과 진단에 매우 유효하다.
한진규 전문의는 “부정맥과 수면무호흡은 단순히 동반되는 질환이 아니라, 서로를 악화시키는 연쇄적 메커니즘의 관계에 있다”라며, “수면다원검사는 단순 진단 검사를 넘어 부정맥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고, 재발과 심각한 합병증을 막기 위한 핵심적 도구”라고 강조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속적 기도양압술(CPAP) 치료는 수면무호흡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심방세동과 심실성 부정맥의 발생률 감소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과 부정맥을 동시에 가진 환자, 야간 심정지 병력이 있는 환자, 심박조율기 착용 환자 등 에서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면무호흡이 대부분 자각 증상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는 단순히 피곤하거나 밤중 심장 두근거림만 느낄 수 있어 정확한 진단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수면다원검사는 이 같은 무증상성 수면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한진규 원장은 “수면무호흡증이 지속되면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며, 이는 부정맥 치료의 안정성과 예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특히 페이스메이커를 착용한 환자에서 수면 중 이상 반응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