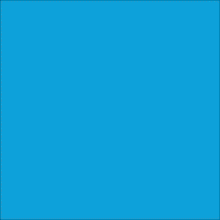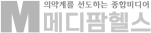아주대병원 신경외과 노성현 교수팀이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김수현 교수팀과 공동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 재발 위험을 예측하는 머신러닝(기계학습) 모델을 개발했다.
요추 추간판 탈출증(Lumbar Disc Herniation, LDH)은 가장 흔한 척추 질환 중 하나로, 수술 후에도 약 5~15%의 환자에서 재발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비만, 흡연, 당뇨병 등 일반적인 위험 인자가 알려져 있었지만, 요추 주변 근육(paraspinal muscle)과 재발 간의 관계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2003년부터 2023년까지 아주대병원에서 요추 추간판 절제술을 받은 126명 환자의 임상 및 MRI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항목에는 연령, 체중, 기저질환 등 인구학적 요인, 수술 관련 인자, 그리고 MRI로 측정한 요추 주위 근육 부피(volume)가 포함됐다.
여러 인공지능 알고리즘(Logistic Regression, LightGBM, CatBoost, MLP 등)을 비교한 결과, 데이터의 패턴을 반복 학습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XGBoost’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모델의 예측 정확도(Accuracy)는 약 79%, 재발 여부를 구분하는 판별력(AUC, Area Under the Curve)은 0.811로, 임상 예측 모델로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특히 허리 뒷쪽 깊은 부위에 위치한 사각요근(quadratus lumborum)의 부피가 55mL 이상으로 발달한 환자에서는 재발 위험이 약 8배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결과는 외부 의료기관 데이터를 이용한 독립 검증에서도 약 92%의 정확도 (AUC, 0.90) 를 보여, 모델의 재현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이번 연구에는 노성현 교수가 개발한 AI 척추 영상 분석 프로그램 ‘SPINEMASTER’(㈜Noh Thinking)가 핵심 도구로 활용됐다.
이 프로그램은 MRI 단면 영상을 자동 인식해 근육·지방·척추체를 정량화하는 기술로, AI 의료영상 분석 분야의 대표적인 국산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연구팀은 이를 통해 “MRI 한 장만으로도 환자 맞춤형 예후 예측과 추적관찰 주기 설정이 가능해,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신경외과학 학술지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JKNS)’에‘Machine Learning Model for Recurrent Lumbar Disc Herniation After Lumbar Discectomy (요추 추간판 절제술 후 재발성 요추 추간판 탈출증 예측을 위한 머신러닝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게재 승인을 받았다.
논문은 아주대병원 신경외과 노성현 교수와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김수현 교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아주대의대 강승엽 학생과 경북대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이수진 대학원생이 공동 1저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