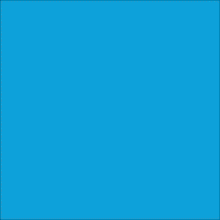식품안전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은 이 오래된 명제를 기술과 정책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핵심 키워드는 분명하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그리고 국민 체감 안전이다.
식품안전은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 국가의 기본 책무다. 정부가 최근 확정한 ‘제6차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2026~2030)’은 이 오래된 명제를 기술과 정책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다. 핵심 키워드는 분명하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그리고 국민 체감 안전이다.지난 5차 계획이 제도적 토대를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6차 계획은 한 단계 더 나아가 식품안전 관리 방식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식중독이 발생한 뒤 원인을 추적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AI가 위험을 미리 예측하고 차단하는 ‘사전 예방형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표적인 사례가 AI 기반 식중독 원인 추적 시스템이다. 원인균과 원인 식품을 자동으로 예측해 확산을 초기에 차단하겠다는 구상은, 식품안전을 ‘경험과 인력 의존 행정’에서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는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식품안전을 바라보는 국가의 시선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축은 글로벌 대응력 강화다. K-푸드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는 만큼, 식품안전은 이제 국내 문제를 넘어 수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 할랄·코셔 인증 지원, 국제식품규격(CODEX) 기준 선도, 해외 콜드체인 확충 등은 안전을 규제가 아닌 산업 경쟁력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해외 기술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은,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감당하던 부담을 국가가 함께 짊어지겠다는 신호로 읽힌다.
눈여겨볼 대목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이다. 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상황에서,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전은 더 이상 복지의 부수 영역이 아니다. 통합급식관리지원센터의 전국 확대, 고령친화식품과 메디푸드 연구 지원은 식품안전을 ‘전 국민 평균’이 아닌 '사각지대 없는 안전망’으로 확장하려는 시도다.
물론 과제도 분명하다. AI와 디지털 기술이 식품안전의 핵심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과 현장 수용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기술이 앞서고 현장이 따라오지 못한다면, 정책은 또 하나의 ‘계획’에 그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영업자와 영세 급식시설이 디지털 전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과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제6차 기본계획이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식품안전은 더 이상 규제와 단속의 영역이 아니라, 기술·산업·복지를 아우르는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는 점이다. 국민의 밥상을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고, 이는 다시 사회의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진다.
AI가 지키는 밥상은 아직 시작 단계다. 그러나 이번 계획은 우리 사회가 식품안전을 바라보는 좌표를 분명히 바꿔놓았다. 남은 과제는 하나다. 이 청사진이 계획에 머물지 않고, 국민의 일상에서 ‘안심’으로 체감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식품안전은 정책을 넘어 신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