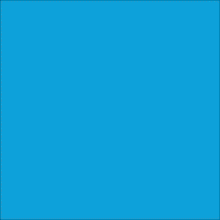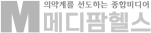작은 상처나 가벼운 외상에도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CRPS)’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질환은 염좌나 골절 같은 비교적 가벼운 외상뿐 아니라 뇌졸중, 척수 손상, 심근경색과 같은 심각한 손상 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손상 부위에 과도한 통증이 장기간 이어진다는 점이다.
일상생활을 무너뜨리는 극심한 통증
순천향대 부천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미순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주요 증상은 ▲자극이 없어도 통증이 나타나는 ‘자발통’ ▲옷깃만 스쳐도 심한 통증이 느껴지는 ‘이질통’ ▲통증이 과도하게 증폭되는 ‘감각 과민’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피부 온도·색 변화, 발한 이상, 부종 같은 자율신경계 이상 ▲근력 저하와 관절 운동 제한 등 운동신경계 기능 장애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원인은 복합적… 진단도 쉽지 않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한 가지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손상된 신경의 과흥분,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작동, 장기간 이어지는 염증 반응, 뇌의 비정상적인 통증 기억 형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원인이 다양하고 환자별 차이가 크다 보니 진단이 쉽지 않다.
특히 말초신경병증, 류마티스 관절염, 섬유근육통 등과 증상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확정 진단을 내릴 수 있는 단일 검사법이 없어, 환자의 증상과 경과를 종합적으로 살피고 여러 보조 검사를 통해 다른 질환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진단한다.
6개월 이내 치료 시작해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발병 후 6개월 이내 치료를 시작해야 예후가 좋다. 이미순 교수는 “치료가 늦어지면 뇌의 통증 회로가 굳어지고, 관절 강직, 골다공증 같은 구조적 변화가 생겨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경고했다.
치료에는 약물치료 외에도 신경차단술, 물리치료, 재활치료, 심리치료 등이 있으며, 난치성 통증의 경우 척수신경자극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통증보다 힘든 건 주변의 오해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주변의 오해다. 외관상 문제가 없다 보니 예민하거나 정신적인 문제 아니냐는 오해를 받고, 더 큰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립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신경계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환자에게 정확한 질환 설명과 공감,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며 “의료진은 단순한 통증 치료를 넘어 환자의 재활과 삶의 질까지 고려한 통합 치료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 목표는 ‘일상 회복’
환자 중 약 70~75%는 증상이 호전되지만, 25~30%는 장기적인 통증과 기능 저하가 남을 수 있다. 완전한 통증 소실은 어렵지만, 꾸준한 치료를 통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하는 것이 현실적인 치료 목표다.
이 교수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고통스러운 만성질환이지만 희망이 없는 병은 아니다. 조기에 진단받고 전문 의료진과 함께 치료 계획을 세운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가족과 사회의 지지, 의료진과의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꾸준히 치료한다면 반드시 이 질환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