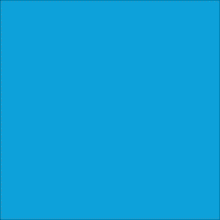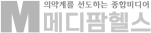전 국민의 노후 보장제도인 국민연금 수령액이 노후 용돈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김성주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전주 덕진)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8월 현재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월 389만원으로 월 소득이 1억원인 사람도 389만원(월 보험료 35만원)으로 적용받아 20년 가입시, 월 평균 62만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월 소득 254만원인 사람이 2012년 1월,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하여 보험료를 월 22만원씩 20년을 가입할 경우, 월 연금수령액은 월 48만원에 그쳤다.
반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은 24만원으로 2012년도 정부가 고시한 최저생계비 55만3천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저소득자는 자기가 낸 돈보다 10배 이상 더 받아가지만, 수령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 이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 예상 연금 월액표
|
평균소득월액(A) : 1,891,771 |
(단위 : 원/월) | |||||||||
|
순번 |
가입기간중기준 소득월액평균액(B값) |
연금보험료 |
가 입 기 간 | |||||||
|
( 9% ) |
10년 |
15년 |
20년 |
25년 |
30년 |
35년 |
40년 | |||
|
1 |
240,000 |
21,600 |
121,910 |
177,860 |
231,290 |
240,000 |
240,000 |
240,000 |
240,000 | |
|
2 |
250,000 |
22,500 |
122,480 |
178,700 |
232,380 |
250,000 |
250,000 |
250,000 |
25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36 |
2,540,000 |
228,600 |
253,440 |
369,770 |
480,840 |
591,640 |
702,430 |
813,220 |
924,020 | |
|
37 |
2,670,000 |
240,300 |
260,870 |
380,620 |
494,950 |
608,990 |
723,040 |
837,080 |
951,120 | |
|
~ |
~ |
~ |
~ |
~ |
~ |
~ |
~ |
~ |
~ | |
|
45 |
3,750,000 |
337,500 |
322,630 |
470,730 |
612,130 |
753,170 |
894,220 |
1,035,260 |
1,176,300 | |
|
46 |
3,890,000 |
350,100 |
330,240 |
482,020 |
626,940 |
771,490 |
916,040 |
1,060,580 |
1,250,130 | |
|
출처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모두 자기가 낸 돈보다 더 많이 받아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수령액수가 너무 적어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에 직접 도움이 못되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국민연금액 계산식은 1.8[A+B][1+0.05n]/12개월인데, A는 은퇴직전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액이며, B는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평균 소득액, n은 20년을 초과 가입한 년도(예, 25년이면 n=5), 계산식 맨 앞의 1.8은 상수로 1988년부터 1998년에 가입한 사람은 2.4, 1999년부터 2007년에 가입한 사람은 1.8, 2008년부터 2027년에 가입한 사람은 1.5(매년 0.015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에는 1.2)로, 수령하게 될 연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 n값을 늘리거나, A값의 평균이 높아야 한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으로 상수가 2.4에서 최종적으로는 1.2로 줄어들어,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지게 되어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이 약화되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할 때 40%이지만,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이 23년에 그쳐, 실질적으로 소득대체율은 20%남짓에 불과하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비정규직 근로자 및 자영업자 등을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로 확대하고, 무엇보다도 오랜 기간 동안 기준소득 상한액을 낮게 묶어 둠으로써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액(A값)이 하향됨에 따라 노후에 수령하게 될 연금의 실질가치가 크게 하락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A값) 상·하한은 과거 국민연금제도 시행초기인 1988년도에 상한 200만원, 하한 7만원에서 1995년 상한 360만원, 하한 22만원으로 인상되었고, 15년간 변동이 없다가 2010년부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상승률로 매년 인상토록 개선되었다. 그러나 상한선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의 수가 지나치게 많아, 실제 소득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적용받는 가입자 수는 1995년에 0.91%에서 2012년 8월말 기준, 14.09%로 증가) ‘95년 대비 소비자 물가는 73%,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은 195%가 인상된 데 반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각각 8.1%, 9.1% 인상에 그쳤다.
김성주의원은 “상·하한이 지나치게 낮아 고소득자의 경우는 월소득 대비 연금액이 지나치게 낮고 하한 가입자의 경우 역시 연금액의 절대 금액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면서, 노후에 용돈을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느냐 같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성주의원은 “내년 3월,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실시되고,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등을 가동할 예정인 만큼, 기준소득월액의 상한 상승률이 실제 임금상승률에 부합할 수 있도록 A값을 국민연금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아니라, 전체 산업 근로자 평균임금이나 자영업자를 뺀 나머지 직장인의 평균 임금으로 바꾸는 방법, 상한의 가입자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낮추거나, A값을 현재보다 몇 배 더 올리는 방안 등 노후 연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